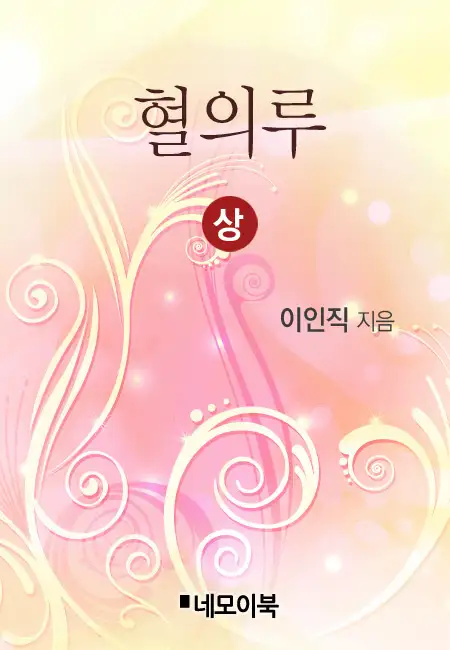
1906년 7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50회에 걸쳐 『만세보』에 연재한 이인직의 신소설.
단행본으로는 1907년 광학서포에서 발간되었으나 그 내용은 『만세보』 연재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혈의루」 하편은 1907년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11회에 걸쳐 『제국신문』에 연재한 「혈의루」 하편과 1913년 2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 65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한 「모란봉」이 있다. 『제국신문』 연재분은 옥련모의 미국방문기이며, 『매일신문』 연재분은 옥련의 귀국 이야기로, 내용 전개상 『매일신문』 분이 「혈의루」 하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912년 12월에는 동양서원에서 「혈의루」 상편을 「모란봉」이라는 제목으로 개제한 정정본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청일전쟁의 전화가 평양 일대를 휩쓸었을 때 일곱살난 옥련이 부모와 헤어지게 되고 부상을 당한다.
처자를 잃은 김관일은 부산에 사는 장인에게 처자를 찾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장인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간다. 남편과 딸을 잃은 어머니는 자살하고자 대동강에 가서 투신하나 고장팔에 의해 구출된다. 한편 일본인에게 구출된 옥련은 이노우에라는 군의관의 도움으로 그의 양녀가 되어 일본에 건너가 소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뜻밖에 이노우에가 전사하자 양모는 변심하여 옥련을 구박한다. 옥련은 갈 바를 몰라 방황하던 중 기차 안에서 구완서를 만나 함께 미국으로 간다. 워싱턴에서 공부를 하던 중 옥련의 기사가 신문에 나게 되자 이를 보고 찾아온 아버지 김관일을 만나게 되고 구완서와 약혼을 한다.
평양에 있는 어머니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의 편지를 받고 꿈만 같이 생각한다. 이 작품은 청일전쟁을 시발로 하여 10년 간의 긴 세월 동안 한국·일본·미국을 전전한 옥련 일가의 기구한 운명을 그리면서, 개화기의 시대 사상을 반영한 신소설이다. 이 작품에는, 구소설적 문체에서 탈피하지 못한 점이나, 사건 전개에 우연적 요소가 남발된 점 등의 미숙성이 남아 있지만, 신교육사상·자유결혼관·봉건관료에 대한 비판·자주독립사상 등의 근대적 정신이 기저에 깔려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취재의 현실성·해부적 구성·묘사의 사실성·새로운 주제의식 등을 통하여 근대소설 이행기의 면모를 보여주는 최초의 신소설이라는 점에 문학사적 의의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작가소개
저자 : 이인직 李人稙
작가‧언론인‧신극 운동가 호는 국초(菊初). 1862년 음력 7월 27일 경기도 음죽 출생.
1900년 2월 관비 유학생으로 도일하여 도쿄정치학교 청강생으로 수학하였으며, 유학 중 일본의 민간 신문 『미야꼬신문(都新聞)』사에서 신문 기자 연수를 받았다. 1903년 노일전쟁 중 한어(韓語) 통역에 임명되어 일본군 제1군사령부에 부속되어 종군했다 1906년 『국민신보』 주필, 『만세보』 주필로 활동하였다. 1907년 6월에는 『만세보』가 경영난으로 폐간되자 이를 인수한 『대한신문』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때부터 이완용(李完用)의 비서역을 맡았다. 한일합방 후 1911년 7월부터 1915년까지 경학원 사성(司成)을 맡아 전국 유림을 관장하는 한편, 선능 참봉과 중추원 부참의를 역임하였다.
1916년 11월 25일 총독부 병원에 입원 치료중 사망했다. 1906년 7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만세보』에 연재된 「혈의루」는 신소설의 성립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작품이다. 청일전쟁의 현장인 평양에서 이산 가족이 된 옥련과 그의 가족이 겪은 10년간에 걸친 시련을 그린 이 작품은, 묘사의 사실성·취재의 현실성·해부적 구성·신교육과 반인습 등의 새로운 주제와 평이한 서술로 전대소설과는 다른 신소설의 한 유형을 제시한 것으로 일컬어진다. 「귀의 성」은 「혈의루」에 이어 『만세보』에 연재한 소설로 ‘위첩변호’라는 비난을 받기는 하였으나 신속한 사건 전개와 카니발리즘적인 잔혹성, 신분적 갈등 등으로 많은 독자를 확보한 신소설이다. 1908년에는 「치악산」 상편과 「은세계」 상권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치악산」은 전대소설 중 가정소설의 구조를 계승한 신소설로 주제의 퇴행성을 드러낸다. 한편 「치악산」의 하편은 김교제(金敎濟)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은세계」는 신극소설의 형태를 띠는데, 탐관오리의 학정을 비판하고 신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신소설로서 정치소설적 성격이 강하다. 현재로서는 이 소설 하편의 발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신극 「은세계」는 1908년 11월 13일부터 원각사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1912년에 단편소설 「빈선랑의 일미녀」를 발표한 이인직은 1913년 「혈의루」 하편에 해당하는 「모란봉」을 『매일신보』에 연재하다 중단했다. 「모란봉」은, 「혈의루」 말미에 옥련이 귀국하겠다는 편지를 평양에 있는 모친에게 부친 것으로 끝난 데 이어, 옥련의 귀국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모란봉」은 옥련을 아내로 맞고자 하는 서일순의 음모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흥미위주로 전개되다가 중단되어 전편에서 볼 수 있었던 신소설적 요소가 사라지고 통속화된다. 「혈의루」 하편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작품으로 1907년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제국신문』에 11회 연재된 「혈의루」 하편이 있다. 그러나 이 하편은 상편과 내용상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인직은 최초의 신소설 작가이자 신극 운동을 한 작가로서, 한국 소설이 근대소설로 전개되는 데 교량적 역할을 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에 드러나 있는 친일적인 경향은 신소설의 주제의식의 한계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06년 7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50회에 걸쳐 『만세보』에 연재한 이인직의 신소설.
단행본으로는 1907년 광학서포에서 발간되었으나 그 내용은 『만세보』 연재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혈의루」 하편은 1907년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11회에 걸쳐 『제국신문』에 연재한 「혈의루」 하편과 1913년 2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 65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한 「모란봉」이 있다. 『제국신문』 연재분은 옥련모의 미국방문기이며, 『매일신문』 연재분은 옥련의 귀국 이야기로, 내용 전개상 『매일신문』 분이 「혈의루」 하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912년 12월에는 동양서원에서 「혈의루」 상편을 「모란봉」이라는 제목으로 개제한 정정본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청일전쟁의 전화가 평양 일대를 휩쓸었을 때 일곱살난 옥련이 부모와 헤어지게 되고 부상을 당한다.
처자를 잃은 김관일은 부산에 사는 장인에게 처자를 찾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장인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간다. 남편과 딸을 잃은 어머니는 자살하고자 대동강에 가서 투신하나 고장팔에 의해 구출된다. 한편 일본인에게 구출된 옥련은 이노우에라는 군의관의 도움으로 그의 양녀가 되어 일본에 건너가 소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뜻밖에 이노우에가 전사하자 양모는 변심하여 옥련을 구박한다. 옥련은 갈 바를 몰라 방황하던 중 기차 안에서 구완서를 만나 함께 미국으로 간다. 워싱턴에서 공부를 하던 중 옥련의 기사가 신문에 나게 되자 이를 보고 찾아온 아버지 김관일을 만나게 되고 구완서와 약혼을 한다.
평양에 있는 어머니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의 편지를 받고 꿈만 같이 생각한다. 이 작품은 청일전쟁을 시발로 하여 10년 간의 긴 세월 동안 한국·일본·미국을 전전한 옥련 일가의 기구한 운명을 그리면서, 개화기의 시대 사상을 반영한 신소설이다. 이 작품에는, 구소설적 문체에서 탈피하지 못한 점이나, 사건 전개에 우연적 요소가 남발된 점 등의 미숙성이 남아 있지만, 신교육사상·자유결혼관·봉건관료에 대한 비판·자주독립사상 등의 근대적 정신이 기저에 깔려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취재의 현실성·해부적 구성·묘사의 사실성·새로운 주제의식 등을 통하여 근대소설 이행기의 면모를 보여주는 최초의 신소설이라는 점에 문학사적 의의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작가소개
저자 : 이인직 李人稙
작가‧언론인‧신극 운동가 호는 국초(菊初). 1862년 음력 7월 27일 경기도 음죽 출생.
1900년 2월 관비 유학생으로 도일하여 도쿄정치학교 청강생으로 수학하였으며, 유학 중 일본의 민간 신문 『미야꼬신문(都新聞)』사에서 신문 기자 연수를 받았다. 1903년 노일전쟁 중 한어(韓語) 통역에 임명되어 일본군 제1군사령부에 부속되어 종군했다 1906년 『국민신보』 주필, 『만세보』 주필로 활동하였다. 1907년 6월에는 『만세보』가 경영난으로 폐간되자 이를 인수한 『대한신문』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때부터 이완용(李完用)의 비서역을 맡았다. 한일합방 후 1911년 7월부터 1915년까지 경학원 사성(司成)을 맡아 전국 유림을 관장하는 한편, 선능 참봉과 중추원 부참의를 역임하였다.
1916년 11월 25일 총독부 병원에 입원 치료중 사망했다. 1906년 7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만세보』에 연재된 「혈의루」는 신소설의 성립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작품이다. 청일전쟁의 현장인 평양에서 이산 가족이 된 옥련과 그의 가족이 겪은 10년간에 걸친 시련을 그린 이 작품은, 묘사의 사실성·취재의 현실성·해부적 구성·신교육과 반인습 등의 새로운 주제와 평이한 서술로 전대소설과는 다른 신소설의 한 유형을 제시한 것으로 일컬어진다. 「귀의 성」은 「혈의루」에 이어 『만세보』에 연재한 소설로 ‘위첩변호’라는 비난을 받기는 하였으나 신속한 사건 전개와 카니발리즘적인 잔혹성, 신분적 갈등 등으로 많은 독자를 확보한 신소설이다. 1908년에는 「치악산」 상편과 「은세계」 상권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치악산」은 전대소설 중 가정소설의 구조를 계승한 신소설로 주제의 퇴행성을 드러낸다. 한편 「치악산」의 하편은 김교제(金敎濟)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은세계」는 신극소설의 형태를 띠는데, 탐관오리의 학정을 비판하고 신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신소설로서 정치소설적 성격이 강하다. 현재로서는 이 소설 하편의 발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신극 「은세계」는 1908년 11월 13일부터 원각사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1912년에 단편소설 「빈선랑의 일미녀」를 발표한 이인직은 1913년 「혈의루」 하편에 해당하는 「모란봉」을 『매일신보』에 연재하다 중단했다. 「모란봉」은, 「혈의루」 말미에 옥련이 귀국하겠다는 편지를 평양에 있는 모친에게 부친 것으로 끝난 데 이어, 옥련의 귀국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모란봉」은 옥련을 아내로 맞고자 하는 서일순의 음모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흥미위주로 전개되다가 중단되어 전편에서 볼 수 있었던 신소설적 요소가 사라지고 통속화된다. 「혈의루」 하편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작품으로 1907년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제국신문』에 11회 연재된 「혈의루」 하편이 있다. 그러나 이 하편은 상편과 내용상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인직은 최초의 신소설 작가이자 신극 운동을 한 작가로서, 한국 소설이 근대소설로 전개되는 데 교량적 역할을 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에 드러나 있는 친일적인 경향은 신소설의 주제의식의 한계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캐시로 구매 시 보너스 1% 적립!
총 금액 0원
최종 결제 금액 0원 적립보너스 0P